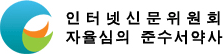11월에 접어드니 늙은 초록, 맑은 노랑과 짙은 주황이 곳곳을 채워갑니다. 곳곳의 틈새에서는 바스락, 낙엽은 흙이 되고 있습니다. 가을, 단풍이 문 열고 들어오니 목엽은 나갈 채비를 하고야 맙니다. 가을은 이면을 고민하게 합니다. 단풍이 드는 앞면에는 신생이, 낙엽이 지는 뒷면에는 소멸이 있는 가을입니다. 신생이 곧 소멸이라는 것이 서글픕니다.
가을의 꽃이라는 코스모스마저 단순하지 않습니다. 휘청이며 올망졸망 길가에 버티고 선 그 자그마한 것은, 우주의 조화라는 자신보다 거대한 이름을 온몸으로 지고, 존재 가치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꼭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신생의 순간 부여받은 이름은 거대하기만 합니다. 원대한 이름인 탓에, 결코 나에 대한 정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 이름이라며 증명하고 쟁취해야만 합니다.
단풍과 낙엽, 코스모스(들꽃)와 코스모스(우주). 이렇듯, 가을은 이면을 고민하게 합니다. 가을은 생과 사의 교점인지라, 아름답다고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아름다워지는 것인가 봅니다. 아름다움은 금방 사그라들고야 맙니다. 절정의 아름다움은 찰나. 단풍도, 코스모스도, 노을도 모두 찰나.
그렇다면, 사그라들기 전의 아름다움은 젊음 내지는 청춘이겠습니다. 그래서 청춘은 외로운 법입니다. 져본 적 없이 피어가기만 한 이들에게 삶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사그라든다는 것은, 진다는 것은 결국 같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움과 만개의 정도는 정해지지 않으니, 벅차고 가쁜 것입니다. 어느 찰나의 변곡점에 들어서서야 아차, 청춘이었네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청춘은, 청춘인 줄 몰라야 합니다.
생의 교점에 사가 있듯, 청춘의 교점에는 낙화가 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낙화>(이형기) 중). 힘껏 아름다웠던 것이 전생보다 먼 감각이 되고, 찬찬히 감각을 되살려가며 아름다움을 추억하고 결국은 추모합니다. 그러므로 낙화는, 낙화인 줄 아는 법입니다.
봄과 가을이 반복되듯, 우리의 청춘과 낙화는 반복됩니다. 며칠 전, 물양장이 내다보이는 창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서서 겹겹이 싸인 석류의 속껍질을 벗겨냈습니다. 석류의 알맹이에는 가을이 들어있었습니다. 영롱한 붉은 색부터, 희말쑥한 상아색까지. 가을의 색이 꼭 창밖의 노을 색과 같아서, 석류를 꼭꼭 씹어먹으면, 가을은 물론이고 노을은 내 것이 될 것 같았습니다. 주인 없는 그것이라도, 남들이 탐내지 않을 그것이라도 내 것이길 바랐습니다.
그때 떠오른 전생 같은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내 것이 될 줄로만 알았던, 열다섯 해도 더 전인 때였습니다. 아빠는 석류를 알알이 까서는 타파통과 오목한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숟가락 하나 들고는, 푸-욱 떠서 알알이 고운 석류를 씹어 삼켰습니다. 그때 먹은 것은, 가을도, 노을도 아닌 세상이었습니다. 아빠는 석류를 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빠, 저는 세상을 먹고 자랐는데도 세상이 퍽 어렵습니다.)
전생 같은 기억에는 청춘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내 것이던 나와 주름살이 지금보다 덜한 아빠. 아름다웠던 찰나. 이제 저는 석류를 혼자 까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떨어진 석류알은 내버리던 버릇을 유물인 양 대물림하고는, 내버려진 석류알을 닦아내는 습관을 들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빠의 곁에서 석류를 받아먹던 때를 그리며 청춘의 시간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또, 별안간 내가 내버린 석류알을 아빠가 닦아냈을 생각에 미안해하며 낙화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물양장을 내다보며 석류를 까는 지금이 청춘이 된다면, 그때는 또 어떤 낙화를 맞이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금은 다행스럽습니다. 여전히, 저의 나중이 궁금하니 말입니다.
가을이 아름다운 것은, 무수한 이면이 들춰지기 때문입니다. 또 가을이 아름다운 것은, 금세 빛바랜 전생보다 먼 순간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청춘은 짧고, 낙화는 깁니다. 낙화를 여운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낙화임을 분명히 알고 가는 당신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