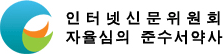지고 피고 지는 것이 어디 나무뿐일까?
굽은 나무 아래 살려면
내 몸이 뒤틀려야 하는 것인데
어린 내게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굽은 나무는 그늘을 옮기는 바람을 봐야 하고
새의 그림자를 읽어야 한다고
넘치면 넘어지는 법이니
둥글게 구르며 살아가라고 하셨다
그늘의 공식을 잊고 살아서 였을까
나는 새의 날개를 꺾기도 했고
비 오는 날은 숲속의 어둡고 습한 방언을 듣기도
했고 나뭇 가지들의 삭히지 못한 이야기는
빗소리에 묻어 두곤 했다
잎은 빗소리를 달고 자랐고 질서가 바뀐 순간
서늘한 목이 잘려 우듬지를 넘어설 수 없으나
그래도 네 이름이 아름다운 건
유배당한 젊음에 햇살 들어 푸르기 때문이었다
멀어진 나무의 푸르름을 손 끝으로 만지면
쌓아 온 볕들이 하나씩 부러졌고
눈 부신 조각들은 다른 시간에 사는 것뿐 같은 공간에
서 있는 것이었다
물과 불이 그랬듯
곧는 나무와 굽은 나무의 공식은
낮아지고 작아져 모든 그늘을 용서하는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