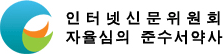문화·관광
-
문화·관광
[서천 문단(文壇)] 비 오는 날의 풍경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오면 부지런한 아낙네들 바쁜 손을 움직이며 들썩인다 여리여리하니 작은 모종들 두 개, 세 개씩 나뉘어 고랑 밭에 심어지고, 하늘이 심술부릴세라 굽어진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밭고랑에 입맞춤을 한다 어찌할까? 어찌할까 바구니에 모종들은 얼굴을 내밀고 어서 나를 데려가라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른다 넓은 밭이 조금씩 조금씩 초록의 물결로 들어차면 시원한 빗줄기 한 바가지 힘차게 뿌려 주기 기다리며 하늘 한 번, 땅 한번 병아리 고개짓이 남사당패 상모 돌리듯 한다 여린 잎들이 가득한 밭에는 고라니가 늦은 점심을 먹으러 뛰어다니고 고라니를 쫓는 강아지 소리 비 내리는 고랑 밭은 어느새 새싹들의 아우성에 나뒹굴며 아낙네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다.
2025-11-15 강정옥 시인(한국문인협회 서림지부 회원) -
문화·관광
[서천 문단(文壇)] 시댁과 친정 사이

설날 아침, 갓 지은 밥 냄새 사이로 묵은 기침처럼 침묵이 흘렀지요 어머니는 조용히 나물을 무치고 나는 옆에서 국을 데우며 서로의 손등만 바라보아죠 하고픈 말은 어느새 젖가락 끝에 걸려버리고 웃음은 익은 나물처럼 간을 맞추다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한마디, "할머니랑 엄마는 왜 말 안 해 ?" 그 순간, 깊게 쌓인 눈 위에 햇살이 스며들듯 오래된 울타리 하나가 스르르 무너졌습니다 가족이란 마음에 둘러친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기까지 참 많은 계절을 견뎌야 한다는 걸 부모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서로 다르되 함께인 것, 그게 가족이라면 울타리란 언젠가 조용히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의 언덕이겠지요
2025-11-11 양화춘 시인(한국문인협회 서림지부 회원) -
문화·관광
[서천 문단(文壇)] 갯벌의 노랫소리

소리 없이 바닷물이 빠져나간 갯벌에는 조그마한 생명이 숨을 쉬며 허리를 편다 기차타고 내린 서천역에서 버스타고 달려온 송석 바닷가 질펀한 갯벌에서는 갈매리떼 끼룩끼룩 즐겁게 노래부르고 숨구멍을 내밀며 올라오는 동죽사이 무지개 되어 내려오는 물총들 밀려가는 썰물과 함께 바구니에 갈고리를 손에 든 아낙네들 질펀한 갯벌에 한 자리씩 자리하고 연신 움직이는 눈동자와 손들 한 손엔 갈고리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뻘 속에 보이는 동죽을 줍고 조금씩 쌓여가는 바구니를 물길에 흔들흔들 흔들어서 망태기에 넣어 넓은 갯벌 한자리 내어준다 어디선가 들리는 노랫소리에 저마다 흥얼거리며 힘든 한숨을 내뱉고 외지에서 온 객을 쳐다보는 눈에서는 서천의 보물 동죽을 자랑한다 한번 캐보라고 권유하는 손에 이끌려 들어간 갯벌에는 생명이 숨쉬고 우주가 빛나고 내 삶이 평온하다 하나씩, 둘씩 손에 들어오는 쾌감에 나그네도 아낙네도 갯내음에 힘듬도 노랫소리 되어 서천갯벌에 살포시 자리 잡고 내려앉는다
2025-10-31 강정옥 시인(한국문인협회 서림지부 회원) -
문화·관광
[서천 문단(文壇)] 허공을 걷는 법

허공을 밟고 선 바오밥 나무를 보았다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일까 잎 대신 줄기로, 줄기 대신 텅 빈 몸으로 중심을 잡고 선 나무 겹겹이 쌓인 모래바람으로도 제 속을 채우지 못해 죽은 자의 의식을 꽉 물고 무덤처럼 능선을 잡고 있었다 모래바람으로 휘어지는 허공은 능선과 나무사이 산 자의 족적을 찍듯 넓힌 숨을 한 줄씩 띄우면 말 없는 말들은 걷는 자리마다 푸르게 쟁여지는 생 그늘은 찢어질 듯 팽팽해졌다 모래바람으로 걷는 법을 아는 나무들 햇빛을 등뼈에 새긴 잎들은 칼날처럼 번득였고 어느덧 모래바람은 바오밥 나뭇가지에 죽은 자의 노래처럼 걸려있었다 맨발로 바오밥 나무의 그늘을 옮기는 허공은 한 음도 놓칠 수 없는 가지런한 모래바람의 리듬을 조율하며 먼 길을 걷는 중이었다
2025-10-17 김도영 시인(한국문인협회 서천지부 서림회원) -
문화·관광
[서천 문단(文壇)] 입추

여명의 탯줄을 자르고 새벽잠에 빠진 귀뚜라미를 깨워 여행을 하고 싶다 목에 개줄 달아 앞세우고 어느 사막의 능선을 올라 장엄한 사막이 아침에 깨어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사막여우는 귀뚜라미를 보고 입맛을 다시며 내 뒤에 붙어 물이 없이 죽을 시간을 재겠지 방울뱀과 전갈이 우릴 기다린 댓가를 요구할 거야 그러면 지금껏 살아온 듯 돈이 없다 말 할거야 치렁치렁 일곱을 온몸에 달고 팔십 육년 막걸리 하나로 사막을 걸어가신 아버지 그리고 그 짐을 놓고 능선에서 가쁜 숨을 쉬며 말했지 없다 굽히지 말고 깡으로 살라고 방울뱀과 전갈 그리고 사막여우를 가까이하지 말라 하셨는데 정작 막걸리는 이렇다저렇다 말씀이 없으셨다 주막 없는 사막을 어이 건너 갔을까 눈물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막걸리를 마시지 않아야 하다가 막걸리를 마시다가 사막을 본다 아버지가 걸어가신 황량한 사막을 보고싶다
2025-10-08 최명규 서천문화원장(대한민국예술명인) -
문화·관광
[서천 문단(文壇)] 신록의 소묘

밭고랑에는 아랫집 할머니 쪼그려앉아 무성한 잡초 쁩기에 구슬땀 아랑곳없다 느티나무 아래 그늘 옆집 할어니 손짓이 애탄다 돗자리끼고 물주전자 손에 든 채 녹음이 더 짙어가라 재촉하는 풀벌레소리는 농부의 일손에도 힘내라 응원한다 파랗게 솟아나는 들녁 보리베고 늦은 모내기 하는 윗집 아저씨의 농심에 희망이 넘친다
2025-10-01 변승연 시인(서천시인협회 회원) -
문화·관광
[서천 문단(文壇)] 옥수수 수염차

대나무처럼 곧은 절개를 자랑하며 하늘로 올라가더니 머리에 커다란 수술 달고 팔다리에 수염 나기 시작 한다 연노랑 수염이 검붉은 수염으로 자라나고 알알이 굵어져 몸집을 키우더니 살랑이는 바람에 춤을 추는 잎사귀 바스락 바스락 합창소리 아름답다 길게 늘어진 수염이 이제는 나를 데려가라 손짓하고 두툼한 가녀린 손끝에서 툭 끊어지는 소리 한겹 한겹 푸르름을 벗어내면 알록달록 아름다운 점들이 자태를 드러낸다 커다란 아궁이에 시뻘건 불을 친구삼아 바글바글 삶아주는 솥단지에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사우나에 몸을 맡기며 맛있게도 익어간다 옥수수 수염차 사이에 찐득 쫀득 옥수수 수염차 한잔에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신선이다 투박한 손들 사이에 영농한 아름다운 옥수수가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 알알이 탐스러운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다
2025-09-19 강정옥 시인(한국문인협회 서림지부 회원) -
문화·관광
[서천 문단(文壇)] 돼지감자 조각달

그 작은 빛 보려 만고풍상 겼었다 울퉁불퉁 손님 작년 봄 땅에 묻고 안부가 여무는 동안 설렜다 1년 만에 햇살 퍼지는 길일 자궁 속 탯줄에 달린 아기처럼 삽과 괭이에 와르르 몰려나와 이슬 차던 해 닮은 얼굴 뙤약볕 내면에 익어갔을 풍경 가을 새의 체취에 감자 속살 말려 대지를 꿈꾸며 찬바람 음미하는 어머니께 두둥실 조각달 띄워 보내는 날
2025-09-11 전형옥 시인(서천시인협회 회원)
-
1
[권교용의 정론일침] 서천군 재정, 군민 삶을 미치는 무게까지 고민해야
-
2
지금, 이 순간 서천군의 재정예산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
3
[강소산의 소소한 이야기] 기다림의 미학, 물잠뱅이탕
-
4
[서천 문단(文壇)] 저수지 나들이
-
5
군, 농업기계임대사업 동부분소 임대 서비스 개시 등 7일 충남 서천군 군정소식
-
6
군-경찰서,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 나서 등 8일 충남 서천군 군정소식
-
7
새해 맞은 장항읍, 기업·단체·개인 후원 이어져 등 8일 충남 서천군 읍면소식
-
8
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등 9일 충남 서천군 지역소식
-
9
문화관광재단, ‘2026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거점기관 선정 등 12일 충남 서천군 기관소식
-
10
진로체험지원센터, 4년 연속 최우수 센터 선정 등 8일 충남 서천군 교육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