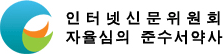장미꽃이 검붉게 피어나는 오월 어느 날은 어머니의 기일(忌日)이다.
그 날 친정식구와 산소를 찾아 인사를 드리고 난 후 돌아오는 발길이 어머니 생각에 떨어지지 않았다.
50여년이 지난 이맘때쯤 어머니와 함께 했던 추억이 문득 머리를 스쳐갔다.
초등학교 고학년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곧장 와보니 엄마가 눈에 띄지 않았다.
가방을 내던지고 곧장 뒷산 산마루에 있는 밭으로 단숨에 올라가 어머니를 찾았다.
등교 길에 슬쩍 훔쳐보았던 어머니의 그늘진 표정이 떠올라 걱정스런 마음에 이곳저곳 찾아 헤매었다.
평소 어머니는 힘이 들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할머니 산소가 있는 뒷산에 가시곤 하였다.
집에서 20분쯤 올라가면 산소가 있다.
점심도 거른 나는 엄마를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어서 배고픈 줄도 잊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산소에 가 보니 짐작대로 어머니는 산소에 엎드려 울고 계셨다.
어머니를 본 순간 안도와 서글픔이 나를 감쌌다.
나는 “엄마… 엄마…” 크게 부르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부를 수가 없었다.
몸을 일으키며 누가 볼세라 두리번거리던 어머니는 수풀사이로 나를 쳐다보자마자 얼른 얼굴을 소맷자락으로 훔치며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나에게 다가오셨다.
“학교 끝났으면 집에서 밥이나 먹지. 뭐 하러 여기까지 왔냐?”라고 나무래 듯이 하였지만, 덥석 안아주시던 어머니의 가슴은 뭐라도 녹일 것 같이 따뜻하였다.
짧은 침묵이 흐르고 바라본 어머니의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고 나는 어머니가 그저 불쌍해 보였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갑자기 땅에 주저앉더니 날보고 업히라 하였다.
“엄마 나 괜찮아. 배도 안고파, 다리도 아프지 않아요.” 만류하고 이내 어머니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가는 숲길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여기저기 흩어져 예쁘게 피어나고 있었다.
마치 어머니의 모습 같았다.
한 송이 꺾어 어머니의 머리에 꽂아드리고 또 한 송이 꺾어 귀에 걸어드리며 기쁘게 해드리려는 막내딸을 눈치 채시고 입가에 웃음을 지어주셨다.
저편에서 울리는 뻐꾹새소리가 왜 그리도 슬프게 들리던지 지금도 오월이 되면 귓전에 맴돌고 어머니의 생전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저리고 울컥하곤 한다.
며칠 전에도 어머니의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고 남편이 “이제 그만 장모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어?”라고 하지만 우리 7남매를 키우느라고 고생하시던 모습을 어린 시절에 어머니 곁에서 지켜보았기에 더욱 그런가 보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