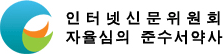그녀의 무릎에 치자꽃 노을이 앉았다
방파제에 풀어 놓은 기침 소리
익어간 바다의 날들을 기억하는 것일까?
아슬한 물빛 침대 온종일 파도처럼 출렁인다
발돋움에 몸 올려 하늘 점치던 당신
나침판이 뱃머리에 꼬리 감추자
그제야, 남편보다 갯벌을 더 오래 품고 살아서였을까
늘 심연은 진창이었다
아린 먹구름 진창에 비 쏟더니
검푸른 바다가 되고
장막 건너온 지문의 결들이 상처를 짚자
마지막 숨비소리 내는 당신
한생이 바다에 뼈 깎고
피 말려 내는 숨비소리
그 소리 만큼 경외(敬畏)로운 소리가 있을까?
굳어 가는 것, 모두를 피해 단단해진 겨울
생살 찢긴 발로 생을 움켜쥐고 있는 그녀의 오리발
수평선에 걸려 곧 쓸릴 것을 예감하지만
요양병원 86호실 침대의 젖어 드는 노을이
그리도 좋아하시던 마지막 치자꽃이라 생각하시는 듯
붉어진 꽃대로 물속 청춘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