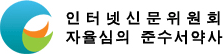“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장독대에 침 마르기 전에 다녀올게요.”
며칠 전 아들 집에 오신 어머니를 혼자 집에 모셔두고 아내와 내가 출근하며 어머니께 드린 말씀이다.
왜 이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왔을까? 문득 내 나이 열 살 무렵의 이야기들이 바로 엊그제 일처럼 떠오른다.
어느 여름날 장에 가시는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칭얼대는 나를 달래시려고, 장독대의 큰 호박돌에 침을 뱉고 기다리면, 그 침이 다 마르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하시면서 장으로 향했다.
난 장독대 곁을 떠나지 못하고 언제 침이 다 마를까 눈이 빠지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장독대 옆 분꽃 잎사귀가 더위에 축 늘어지고, 내가 몇 번이나 다시 뱉은 침이 다 마를 때에야 집에 돌아오셨다.
모든 것이 궁하던 어린 시절, 시장에서 돌아온 어머니의 모습보다 더 반가운 것은 장에 다녀온 어머니의 시장바구니였다.
어머니는 어려운 살림에도 한없이 기다렸던 아들 생각에 상처 난 과일 몇 알이라도 잊지 않고 사 오셨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그 상처 난 과일 몇 알을 사 오셨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메어 온다.
이제 90을 바라보시는 어머니는 그 옛날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아들을 기다리신다.
어렸을 적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은 장바구니 안에 있는 군것질거리 때문이었지만, 지금 어머니는 그저 아들이 그립고 보고 싶어 기다리신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난 어렸을 적 내가 어머니를 애타게 기다리던 그 기다림의 애잔함이 생각났던 것이다.
아들 집에 오신 어머니는 하루종일 아무것도 하실 일이 없다.
TV를 보는 일도 시들해지고 집안이 꼭 감옥 같이 느껴지시나 보다.
고향에서는 아파트 경로당에 가서 점심도 드시고, 10원짜리 화투도 치시면서 소일하셨다.
그저 집안일들을 이야기하고, 자식들 자랑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 연배의 노인들의 일상이었다.
그런데 아들네 집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퇴근한 아들내외 붙잡고 같은 경로당에 있는 밉상스러운 할머니 흉보는 일이나,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부터 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살자고 해도 한사코 마다하신다.
오랜만에 아들네 오셨는데,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싶고, 곁에서 함께 하루종일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이다.
내가 출근하고 나면 오늘도 어머니는 9층 아파트 창문을 내다보시면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 오기만 기다리실 게다.
아들이 오면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지 속으로 연습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안쓰럽지만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서며 몇 가지 당부를 남긴다.
“가스 불 함부로 틀지 마시고, 데워 드실 거는 전자레인지를 쓰세요.”
“냉장고에 피클 담아 둔 것은 원래 시큼한 것이니까, 쉬었다고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금방 돌아올게요. 장독대 돌에 침 뱉어 놓은 것 다 마르기 전에요.”
“그래 운전 조심하고 잘 다녀오너라. 내 걱정일랑 말고.”
아들의 짓궂은 농담에 씩 웃으시며 돌아서는 등 굽은 어머니를 보니, 그 옛날 장에 가시던 곱고 예쁜 어머니의 뒷모습이 눈물 나게 다시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