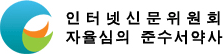이제, 나흘에 걸친 설 연휴가 시작된다.
설 연휴는 주말·주일(21∼24일)을 포함하는 데다, 3.9 대선을 한 달여 앞뒀던 지난해 닷새 연휴보다 짧다.
이 기간 전국에서 2,000만 명이 고향과 친지를 찾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된다.
지난 2020년 설 연휴·추석 연휴부터 지난해 추석 연휴까지 무려 6차 례나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자제되온 고향찾기가 자제돼온 때와 다르다. 그때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설답
지 않은 설이 됐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 고향 방문 자제를 국민에게 요구했었다.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에서는 포장 음식만 가능하고 실내 식사까지 금지됐다. 이런 바람에 설레던 설 풍경은 코로나에 묻혀 조상의 덕을 기리던 모습까지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이번 설은 지난 3년 명절 때와 다르다. 코로나19 고향 방문 자제된 그간과 달리 이 ‘자제 족쇄’가 풀렸다.
이에 따라 어머니·아버지 품 같은 고향을 코로나19 부담을 던 채 향할 수 있다.
이번 설 명절에는 흩어졌지만, 오지 못했던 온 가족들이 모여 떡국을 나누며 정담을 나눌 수 있어 설렌다.
꿈에도 그립지만, 자주 찾지 못한 고향 충청도와 코로나19가 염려하며 명절 때 오지 말라며 손을 내젓던 부모·형제들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설은 내 고향의 향기, 그립던 가족들의 정겨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들 뜬 명절이 아니라 답답하고 팍팍한 삶을 보면 우울한 명절이다.
나라 꼴이 지난해 3.9 대선과 6.1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쪼개진 후유증은 정쟁이 극치이며, 진보·보수 간 진영 논리가 굳어졌다.
전·현직 정권 간 충돌과 과거 정권 들추기, 이에 맞선 떼쓰기가 마치 6.25 직전 정국 상황과 비슷하게 좌·우 간 테러에 가까운 공방이 심각하다.
선거를 통해 자질이 부족하고 엉터리 독선주의자들이 엉겁결에 뽑히다 보니 지방과 나라 꼴이 동력을 잃고 있다.
미래가 걱정될 게 뻔한데, 10년도 가지 않는 권력을 쥐고 오만하고 교만하니 한심스러운 점이 설 차례상에 오를 게 뻔하다.
명절 밥상에 ‘이재명이 어떻고’, ‘윤석열이 어떻고’, ‘김성태가 어떻고’, ‘김건희가 어떻고’, ‘이태원 참사가 어떻고’, ‘이상민이 어떻고’, ‘한동훈이 어떻고’, ‘나경원이 어떻고’,‘김태흠이 어떻고’, ‘최민호가 어떻고’…
판을 칠 것이다.
여기에다, 코로나로 심화한 경기 침체로 고물가·고금리로 서민들의 삶도 더 어려워진 것도 명절 민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차례상을 보기 두렵다고 말할 만큼 안 오른 품목이 없다.
나라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유가·원자재가 폭등을 이유로 들지만, 국가의 물가 관리는 어설프다.
농·축·수산물과 공산품 등 안 오른 게 없는데,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탓으로 돌리고 침체한 부동산 경기를 부동산 안정으로 분석하는 터다.
어린이들의 과자 등까지 다 올라 주부들이 장보기가 겁난다는 하소연한 지 이미 오래다.
농촌에 가봐도, 산지의 쌀값 등 농산물가격은 거의 그대로인데 농자재가격은 크게 오른 게 그 예다.
국민 80% 대의 서민들은 이 험난한 경기 침체, 고물가 시대에 힘들게 견뎌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나라냐’라며 정권교체를 외치며 탄생한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 중 지금도 입장은 그대로일까.
또한, 내년 4월 있을 제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과 ‘ 거대 더불어민주당 심판’으로 귀결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이번 설 명절은 ‘민심 비빔밥’이 될 것이다.
심지어 오는 3월 8일 있을 전국의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선거판에는 어느새 여야 정치인들이 개입, 말이 많다.
이처럼 무례와 무원칙, 무시가 판치는 이 사회에 우리는 몇 년 만에 모처럼 설 명절을 맞는다.
이 때문에 정치가 어떻든, 경제가 어떻든 설레고 들뜬 설 명절, 정겹고 사랑이 넘치는 만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